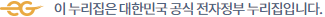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 작성일
- 2024.01.25
수필 가작
그녀들
권영경(인도네시아)
“이부(ibu :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어로 보통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쓴다)가 슬플 것 같아서”
나의 두 번째 ‘그녀’가 울면서 한 이 말이 나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동남아시아 인구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
이제 이 곳에 산 지 햇수로 7년차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서울 수서동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실 평수가 13평도 채 되지 않던 그 작은 집에서 했던 일은 그저 귀여운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매일 청소기를 밀고, 바닥을 닦고, 빨래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집안일이 그 당시 직장인이었던 나에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렇다. 결혼 전 난 집안의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던 나이만 먹은 30대였다.
서른 다섯이 넘도록 집안일이 ‘내 일’이라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를 낳고 200일이 지나 이 곳에 왔다. 마음만 먹으면 아니 돈만 있으면 집안일도, 육아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전업주부였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나는 쉽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창 손 많이 가던 돌 안된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하루 종일 2층 집을 쓸고 닦았다. 그렇게 매일 두세 시간 티도 나지 않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 제서야 알 았 다. 35년 동안 우리 집의 안락함은 엄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육아만으로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집 안의 ‘내 일’ 때문에 나는 남편과 자주 다퉜고,많이 울었다. 미련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결국 내 손목은 손을 쓸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 행주 하나 짜기도 힘겨웠고 결국 도우미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첫 번째 그녀’가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 사십 대 후반의 여자였다. 매일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시간을 일했다. 단 한번도 엄마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집이 치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비교할 대상도 없었지만 그저 누가 ‘내 일’을 대신 해 주는 것 만으로 그녀의 모든 것이 훌륭해 보였다. 사람도 부려 본 사람이 부린다고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해 놓고도 나는 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의지할 사람 없던 타지 생활에서 그녀는 내가 했어야 할 ‘내 일’을 해 주는 구세주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없다면 나는 엉망이 된 손목을 붙잡고 낮엔 집을 치우며 울고, 밤엔 남편을 대상으로 무서운 파이터가 되었을 테니 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첫 번째 그녀와는 sad ending, 아니 최악의 결말로 헤어졌다. 그녀는 우리 집이 비어 있던 1주일 동안 집 안의 (많지도 않던) 모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믿었던 만큼 상처가 컸고 나는 한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거의 1년 동안 도우미를 쓰지 않았다.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주재원으로 몇 년의 기간을 정해 나와 사는 사람들, 사업차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사는 한국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사람들. 이 부류에 따라 도우미를 쓰는 형태도 달라진다.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통 회사에서 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사람을 쓴다. 기사, 유모, 상주 식모 모두 섭렵하고있다. 사업차 나와 있는 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지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아이 하나당 유모도 한 명씩 고용되곤 한다. 8~10만루삐아(우리 돈 6천 원~만 원)면 마치 모든 가구를 죄다 넣어 마구 흔든 상자를 세 시간 만에 멀쩡하게 돌려 놔 주니 도우미를 안 쓸 이유가 없지만 쓰지 않을 이유도 충분히 많기에 나는 ‘그녀들’이 없어도 그리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둘째가 생겼다.
배는 무겁고 첫째는 자꾸만 매달린다. 역시 혼자 감당할수가 없었다.
주재 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 집에서 일하던 ‘그녀’가 우리 집으로 왔다. 그녀는 서른이었고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다고 했다. 그녀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우리 집에 왔다.
나의 ‘두번째 그녀’는 첫 번째 그녀와 다르게 조용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불필요한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이 곳에 살던 7년 중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이다. 내 배가 불러 오는 것도, 그 배가 순식간에 꺼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 오르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곁에 있었다.(나는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를 하늘로 보냈다) 그런데 인간이란 몹시도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내 슬픔의 크기만 봤지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5년만에 찾아온 아이를 배 속에 품고 내 운동화를 빨고, 우리집 화장실을 닦고 있었다.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이부(ibu)가 슬플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내 슬픔을 보느라 자기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출산을 위해 결국 나는 그녀와 헤어졌지만, 내 아이가 입던, 가지고 놀던 것들 중 가장 멀쩡하고 튼튼한 것들은 물려주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아이와 함께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었다.
나의 ‘세 번째 그녀’는 두 번째 그녀의 친구였다. 출산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녀와는 몇 달 함께하지 못했다.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바람에 상주 도우미가 아니면 출퇴근 도우미는 위험하다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주 가난했다. 코로나 상황이었고 내가 그녀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굶어야 했다. 사정을 아는 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기약도 없는 약속을 하는 대신
나는 그녀에게 매달 (일하지 않 아도) 돈을 보내 주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그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지긋지긋하던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나는 다시 그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네 번째 그녀’는 무척 쾌활했고 , 지금의 ‘다섯 번째 그녀’도 인도네시아의 기온을 닮아 따뜻한 사람이다.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무는 3시간 동안엔 공기마저 부드럽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금 매우 안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가 다녀갔다. 어제 오후 아이가 쏟아 놓은 화장실의 물감 통은 모든 색을 버리고 투명하게 반짝인다. 주방 가스레인지 옆 잔뜩 튄 생선 기름때도 말끔하게 지워졌다. 바닥은 더 이상 끈적이지 않고 침대 위 이불은 호텔의 그것 마냥 안으로 쏙쏙 잘 말려 가지런하다.
일주일에 두 번, 그녀가 우리 집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변기를 닦고 가져가는 돈은 12,000원. 내가 밖에서 갈비탕 한 그릇 사 먹는 비용으로 그녀의 가족은 일주일을 산다. 그녀들의 노동으로 나는 책을 읽고 아이와 눈 한번 더 맞추고, 이렇게 글을 쓸 시간을 번다.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그저 시간과 돈일까?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 곳에 사는 몇몇 소수의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들’을 보이지 않는 기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가난하다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집과 차의 크기가, 언어와 얼굴 색이 그 사람의 계급일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나라를 떠나 이방인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수 적 감정’을 마주한다. 우리가 이곳의 ‘그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백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해 본다. 관계는 계급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내 안락함 뒤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놓치지 않으리라.그녀들의 희생이 우리 엄마들의 희생과 같은 선 위에 있음을 기억하리라.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소수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다. 누구든,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그와 그녀가.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자.
나는 오늘도 ‘그녀’의 도움으로 깨끗한 식탁 의자에 앉아 이 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
- 이전글
- [수필] 친정
- 다음글
- [수필] 거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