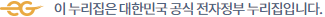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 작성일
- 2024.01.25
수필 우수상
그리운 떡메질 소리
류일복(한국)
성남 형네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태평음식거리 공터에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에 조건 반사적으로 지나던 걸음을 꺾는다. 금시 사람들 머리 위로 휙 하고 솟았다가 쑥 잦아드는 시허연 나무 몽둥이는 틀림없이 떡메다. 떡구시를 퉁탁 퉁탁 때리는 듣던 소리가 귓맛을 당겨 얼른 사람 바자를 친 허리 틈새를 비집는다. 머릿수건을 이마에 동인 부자 지간인 듯 복사판인 두 사람이 하얀 입김을 쏟아내 가며 힘있게 번갈아 치고받는 떡메질 절주에 한 겨울에도 등거리가 거무스레 젖어 절반 선이 그어졌다.
얼마 만에 보는 떡메질인가? 오랜만인 건 반갑다. 공터 뒤 2층 건물에 “연변떡메찰떡”이라는 음미만 해도 떡메를 잡은 손맛이 입안 가득 차지게 서려지는 고향 정다운 간판이 굵은 견고딕체로 돋을새김 되어 단단히 붙어 있다. 골목 담벼락에 벽화로만 남을 풍물을 새삼스럽게 되새겨주는 현장감이 가슴에 잔잔한 격정의 윤슬로 넘실거린다.
어릴 적 동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떡메질 소리는 또 누구 네 집에 잔치가 있구나 하는 희소식의 알림장이었다. 200여호 되는 마을에 두석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있는 결혼, 첫돌, 환갑 잔칫집은 그때 시절엔 드물지 않는 일이었다. 그 잔칫상 모두에는 의례 빠질 수 없는 찰떡이 푸짐한 음식가지 속 중심을 차지했다. 신랑 각시의 결합엔 잘 살라는 의미로 착착 달라붙는 찰떡궁합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더이상 없지싶다. 첫돌 아기도 건강하게 잘 크라는 뜻과 환갑을 쇠는 어르신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앉으라는 뜻에는 쫀득하고 끈끈하고 질긴 찰떡의 속성을 담았겠다. 의례 하례객들이 식사하고 돌아갈 때는 오늘날의 수건 같은 작은 기념품 대신 콩고물을 묻힌 찰떡 한 사발과 미역국 한 사발씩 들려 보내곤 했다. 주인집만큼 며칠 동안 동네 분위기는 끓어올랐는데 찰떡과 더불어 색다른 음식들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즐겁고 신나는 기분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도 덩달아 생기가 돌았다.
그만큼 잔칫집에서는 찰떡을 정성 들여 큰 함지로 두세개 준비했다. 따로 떡방앗간이 없던 시절이었고 떡가루를 내는 디딜방아의 방식과 달리 푹 익힌 고슬고슬한 찹쌀밥의 찰떡 다지기는 떡메질이 최고 해결사였다. 될수록 송진과 옹이가 없어야 하고 단단하고 나이테가 깊은 오래된 고로쇠나 참나무 재목으로 만들어진 떡구유와 떡메를 보유한 집에서는 선뜻 잔칫집에 빌려주곤 했다. 찰떡의 단점은 빨리 굳어지기때문에 잔칫집에서는 당일 친 떡을 사용하곤 했다. 미리 힘깨나 쓰는 청장년 너덧 정도가 새벽부터 떡 치러 불리어온다. 이들은 둘씩 짝을 무어 떡메질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찹쌀밥이 튀어나갈까 아이 볼기 어르듯 떡메를 꾹꾹 박아이기다가 잘 공글려지는 정도에 따라 점차 박자를 맞추어 엇갈아 도끼질하듯 내리찍는 간격을 늘려 갔다. 밖으로 찰밥이 튀어나가는 것을 밥주걱으로 막거나 잘 쳐지도록 정수를 구유에 뿌려 가며 찰떡을 안으로 모으는 일은 하얀 머릿수건을 동인 아낙네가 보조했다. 머릿수건을 꽁꽁 동이고 나선 아낙네의 이유는 머리카락이 혹 떡 구유에 흘려 들어갈 것을 유념해서였다.
박자가 빨라짐에 따라 떡메도 높이 쳐들리고 쉭쉭 바람을 가르기 시작하면서 떡메질꾼의 헛차, 엿차 하는 먹임 소리와 함께 떡메질이 제 궤도에 오른다. 함께 맞장 뜨듯, 맷집 좋은 녀석 곤장 때리듯 허공에 반원을 그리는 떡메질을 서로 주고받으면 순백 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처럼 떡도 하얗게 뭉쳐졌다가 엿가락처럼 차지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새 청장년들 목과 겨드랑이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땀을 들이는 사이 아낙네가 잽싸게 밥주걱으로 덜 쳐진 떡을 한데 모으거나 떡구유에 달라붙은 찰떡을 들쳐 가며 정수를 뿌렸다. 다시 시작된 떡메질에서 청장년들은 더운 웃통을 벗어 내치거나 떡메를 단단히 감아쥐기 위해 손바닥에 침도 뱉곤 했다. 엇박자가 생기면 다치기 십상이라 힘이 부쳐 쉬는 동안 다른 짝패가 번갈아 떡메질을 하곤 했다. 힘이 들어갈수록 찰떡이 더 찰지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었다. 그래서 떡메치기는 힘자랑이 되기도 했다. 무게 2~4킬로의 떡메는 한참 치고 나면 상대방은 중도에서 쉬자고 헐떡 거리면서 말을 꺼내긴 당연지사다. 한 쉼 하면서 청년들끼리, 입이 걸쭉한 아낙네까지 끼어 힘이 달리는 청년에게 무골충이라 시시덕거리며 골려 주고 반죽이 잘 된 찰떡처럼 농담반 덕담 반 걸쭉하게 주고받으면서 흥겹고 즐거운 경사의 아침을 맞곤 했다. 이때 떡메질을 잘하는 힘 좋고 끌끌한 총각들이 눈썰미 좋은 딸 가진 아낙네의 맘에 들어 후에 결혼 잔칫집이 또 하나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총각들도 딸가진 아낙네나 이모 사이가 되면 잘 보이기 위해 더욱 먹임 소리를 내지르고 떡구시가 깨질 듯 무쇠같이 씩씩하게 떡메를 휘두르기도 해서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렸다
찰떡 다지기가 다 되어 가듯 퉁탁 퉁탁 때리는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자 나는 잠시 추억에서 헤어 나왔다. 부자간이 떡메를 내려놓고 둥근 울타리가 긴 줄로 바뀐다. 줄 끝에는 하얀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겹저고리 팔소매를 걷은 아낙네가 이미 분공되어 있다는 듯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야의 맑은 물을 물찬 제비마냥 살짝살짝 손가락에 묻혀 가면서 떡구시에서 나무 함지박으로 옮겨진 찰떡을 식칼로 베어 콩고물을 돌돌 묻혀냈다. 날래게 비닐주머니에 담아 고객 손에 넘겨주는 것이 부지런하고 알뜰한 우리 민족 고유의 여성 향기를 다분히 체감할 수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직접 쳐낸 떡메 찰떡 현장을 마침 잘 만났다 싶어 나도 줄 끝에 미끄러지듯 합류한다.
고향 잔칫집에는 엄마도 한몫했다. 마을 잔칫집에서는 점심과 저녁에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부리 여물고 부엌일도 걸싸게 잘하는 엄마가 자주 불리어 가서 일손을 돕곤 하는가 하면 저녁 오락 마당에서도 흥과 분위기를 돋우는 선줄꾼이었다. 식사를 물린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신랑 각시를 중심에 세운 오락 마당이 펼쳐졌는데 그때도 잔치잡이는 적당한 대목에 엄마를 불러내곤 했다. 엄마는 얌전하게 추는 도라지나 여성다운 춤이 아닌 디스코 비슷한 자신만의 끼 있는 춤을 추곤 했다. 구들장 꺼질 듯 어깨를 들썩들썩, 몸짓이 어우러진 신바람 나는 춤사위에 구경꾼들은 재미있다고 손뼉을 치거나 배를 끌어안고 폭소를 터치기도 하고 같이 덩실덩실 흥겨운 어깨춤에 빠지기도 했다. 내가 엄마가 창피하다고 춤추지 못하게 다리를 잡거나 옷깃을 잡아끌면 아랑곳하지 않은 엄마에 앉은 자리에서 질질 끌려가 패대기쳐지곤 했다. 그러면 구경꾼들이 나를 끄집어냈고 강냉이 뻥튀기나 알사탕을 손에 쥐어주며 달래곤 했다. 그때 잔치설거지 끝에 찰떡과 미역국, 산채 비빔처럼 한 사발에 이것저것 담은 잔칫상에 쓰고 남은 기름진 요리를 넉넉히 얻어 와서 우리 세 아들에게 맛보이는 즐거움에 엄마가 더 적극적이었는지도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해진다.
엄마도 이젠 계시지 않는 지금, 그때의 떡메치기 하던 총각 나이를 넘은 나도 삶 따라 떠난 시골 마을엔 처녀, 총각들의 발그림자가 눈 씻고 보아도 남아 있지 않다. 두만강 상류에 있는, 눈이 무릎까지 오는 날이면 버스도 이삼일씩 잘통하지 않던 오지마을이 너도나도 멀리 번지 없는 주소지로 이사해 몇 호가 남지 않았다. 왁자하던 마을 결혼 잔칫날도 주인공 없어 그냥 꿈결인 듯 오랜 추억 속의 한 장절로만 마음속에 깃들어 있었다. 따라서 절주 있게 떡메를 비스듬히 내리찍는 바람 소리와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던 먹임 소리로 약동하던 젊음의 분위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무 울바자 틈새로 엿보이던 눈썹마루에 앉아 동네의 끼끗하고 힘깨나 쓰는 총각들과 다소곳이 손가락 여물을 썰며 수태를 머금던 처녀들의 떨리는 속삭임이 들려오던 연애 풍경, 고풍스러운 빈 자취만이 정서에 아련하다.
잔칫집이 되어야만 얻어먹을 수 있던 옛시절의 귀한 찰떡이어서였을까. 전통시장 떡방앗간이나 마트, 언제 어디서든 단돈 몇 푼으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기계로 쳐진 찰떡은 종류도, 빛깔도 다양하지만 옛맛이나 옛 분위기가 어우러지지 않는다. 오늘 떡메 찰떡이 잔칫집 분위기를 띄우는 듯 흥성흥성한 기분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터다. 손맛이 느껴지는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온기의 떡메 찰떡 비닐주머니를 싸안으니 벌써 정이 차오른다. 나하고 일곱 살 터울의 형도 공감할 옛 고향의 향수에 신바람 나서 길을 다시 재촉한다.
- 이전글
- [수필] 거미의 집
- 다음글
- [수필] 오늘도 맛있게